
(베이징=신화통신) 우크라이나 위기가 미국과 이익 집단에 의해 '거대한 사업'으로 변질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미·우 광물 협정을 서둘러 추진해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삼켜버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시작은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크라이나 충돌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을 대표로 한 각 이익 집단이 충돌을 유지하려는 '동력 메커니즘'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즉 무기 판매상은 계속해서 주문을 필요로 하고 금융 자본은 시장의 변동성에 기반한 투기를 일삼고 있으며 자원 대기업은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통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미국의 정치 체제를 통해 서로 강화되며 '철의 삼각지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됐다.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본질적으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장사다.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각종 지원금의 대부분이 "미국의 국방 산업"으로 흘러간다고 인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무기와 탄약은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생산은 미국에서 이뤄지고 자금도 미국에 머무르며 세금 역시 미국에 납부된다"며 미국 의회와 정부가 배정한 대(對)우크라이나 원조금 중 최소 75%가 미국 내에 남는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원조'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통해 미국 군수 산업의 생산을 자극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수단인 셈이다.
주목할 점은 군산복합체의 이득이 전통적인 무기 판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돌이 계속되면서 미국 군수업체들은 차세대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시험을 가속화하고 있다. 드론에서 전자전 장비, 정밀 유도 탄약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지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은 사실상 미국 군수업체의 '무기 실험장'으로 전락했다.
군수업체가 무기 판매로 직접 이익을 챙기는 동안 월가의 금융 그룹들은 은밀한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미 연준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했고, 덕분에 리스크 회피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결과를 거뒀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월가엔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대종상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미국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에 최적의 거래 기회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격화된 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했고 이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미국은 이를 기회 삼아 유럽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확대하며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특히 에너지 위기로 인해 유럽 제조업의 비용이 크게 상승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칩과 과학법' 등 고액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유럽의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시켰다. 이러한 산업 이전은 직접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금융 패권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은 미·서방 이익 집단의 세 번째 표적이 됐다. 미국이 핵심 광물로 지정한 50종의 광물 중 우크라이나는 22종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첨단 기술 산업과 국방 산업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미국은 '원조와 자원의 교환'이라는 정교하게 설계된 모델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표면적으로 영토 분쟁과 지정학적 정치 게임처럼 보이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실제론 미국의 군수업체, 금융 자본, 자원 대기업들이 오랜 시간 기획해 온 결과다.
불을 지른 자는 결코 평화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 한 언론의 시평은 폭리를 맛본 군수업체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구하기 위해 돈벌이 열차에서 내릴 것이라는 바람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군수 거대기업과 금융 거물의 편에 선 이들은 결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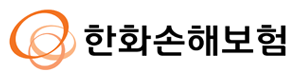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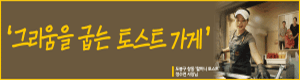







![[르포]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팝업스토어 오픈...참여형 전시로 소비자 마음 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161056524451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