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점점 더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행정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고 일본은 눈에 띄는 맞대응 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공세와 일본의 침묵이 대비되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 모두 계산된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에게 대만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이 걸린 핵심 사안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중국이 군사적 충돌 대신 경제적·제도적 압박을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는 힘을 과시하되 통제 불능의 상황은 피하려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행동 양식이다.
일본의 대응은 보다 신중하다. 일본은 중국의 압박에 즉각적인 강경 대응으로 맞서기보다는 미·일 동맹과 국제 규범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간을 벌고 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문제의 성격을 환기시키는 전략이다. 일본은 지금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중·일 간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주변국의 태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과의 전략적 보조를 맞추며 상황을 관망할 것이다. 즉, 지금의 대립은 폭발을 향한 질주라기보다 관리된 긴장의 지속에 가깝다.
문제는 이 국면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이다. 그동안 한국 외교에서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편의적으로 사용돼 왔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면 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강대국 간 경쟁이 안보와 공급망,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이분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강대국 사이에서 원칙 없는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택을 미루는 전략은 중립이 아니라 취약함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고전에서 말하는 중용은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 위에서 감내할 것을 감내하는 결단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계산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쪽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며 제3국의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모호한 기대를 품고 줄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전략이다.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한국 외교가 출발해야 할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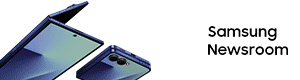

















![[현장] LG CNS·엔비디아가 제시한 AI 격변기…AI 서울 2026서 현 AI 진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62606850193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