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기울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지 공략법이 재편될지 주목된다. 한중 관계 완화 움직임으로 외교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중국은 전기차 수요·공급망·가격 경쟁의 기준점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부상했다. 현대차그룹의 현지 점유율이 1%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중국 전용 전기차 투입 이후 투자·라인업·시장 잔존 방식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계에서 인도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는 1916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9% 늘었다.
이 중 중국 시장은 1231만5000대로 약 64.2%를 차지해 세계 수요의 절대 축으로 자리잡았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중국 기업인 BYD(약 369만대)와 지리 그룹(201만4000대)이 1·2위를 기록하며 중국 중심화 현상이 명확해졌다.
현대차그룹은 같은 기간 약 57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8위를 기록했다. 아이오닉5·EV3 등 글로벌 제품군이 판매를 견인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 미만 수준에 머물러 존재감이 제한된 상태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16년 7.5%(179만대)에서 지난해 0.9%(20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을 완전히 비워 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은 전기차 가격·배터리·충전 인프라·소프트웨어·OTA 업데이트 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으로, 글로벌 완성차 그룹이 전기차 전략을 설계할 때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일렉시오를 포함한 중국 전용 전기차 투입도 철수와 확대 사이에서 시장 잔존을 통한 반등 시기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비중 확대를 목표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를 555만대로 제시하면서 중국 판매 비중을 전체의 약 8%(연간 약 44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1% 안팎의 점유율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수치지만, 전기차 산업의 기준이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존재 자체가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중 관계 완화 조짐도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 양국 정상 간 회동으로 경제 협력 채널 복원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인증·통관·딜러·파트너십 등 비가격 요인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외교 이벤트가 시장 반등으로 직결되기는 어려운 만큼 판단 기준은 여전히 실물 지표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 가격과 기술 생태계가 동시에 형성되는 시장이라 시장 잔존 여부가 곧 전략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중국 사업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어디에 둘지가 향후 글로벌 전기차 전략의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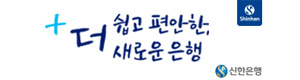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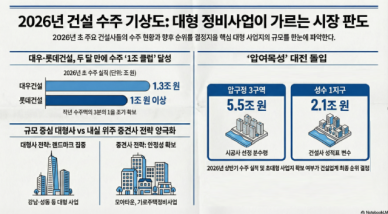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