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이 36%를 기록하며 삼성전자(34%)를 앞섰다. SK하이닉스가 D램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변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로 경쟁사를 압도하면서 일어났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에 HBM3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HBM은 기존 D램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폭에서 월등한 성능을 갖춘 고부가가치 메모리로 AI 서버의 연산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델오로그룹은 지난달 20일 지난해 서버 및 스토리지 부품 매출이 사상 최고치인 244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맞춤형 가속기,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 급증에서 비롯됐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SK하이닉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 약 38억7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를 투자해 차세대 HBM 패키징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설립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경우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주요 제품인 HBM을 포함한 주요 고부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관세 회피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HBM 생산 대부분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관세 부과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오히려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다. 관세 리스크는 피했지만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에 뒤처졌기 때문에 HBM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당장은 관세 회피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 SK하이닉스 대비 높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위치에 처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기술력뿐 아니라 수요 타이밍과 공급망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수익 구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다”며 “반면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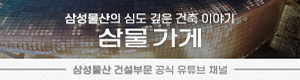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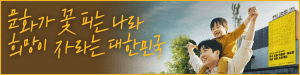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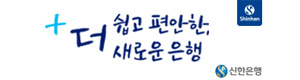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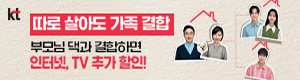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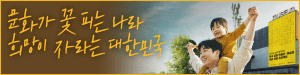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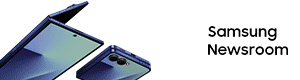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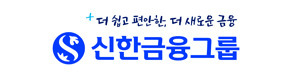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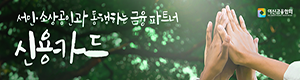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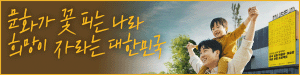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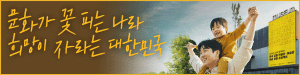
![[SWOT 난제분석] 하나금융, 연간 순익 4조원 시대 눈앞…은행이 끌고 비은행은 숙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2/20260122145207218311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