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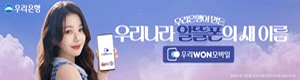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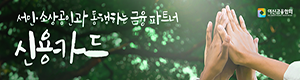








![[지다혜의 금은보화] 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0259811419_388_136.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03247236525_388_136.jpg)
![[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4/20260214081513276488_388_136.png)
![[류청빛의 요즘IT]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11825540250_388_136.pn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