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리가 무성한 나무 옆에 새 한 마리가 책을 베고 누워 있다. 이를 바라보는 두 마리의 새는 마치 공부하느라 수고한 딸을 보듯 대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소설 '파랑새'는 주인공들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내용이다.
그림에서 등장하는 의인화된 하얀 새 또한 행복을 표현하는 부모이고 자식이고 동료이다. 마치 파랑새처럼.

[이영지 작가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선화랑에서 이달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이영지 작가(43)의 개인전 '네가 행복하니 내가 행복해'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나무와 새들을 소재로 '행복'을 담은 회화작품 36점을 선보였다.
22일 산화랑에서 만난 이영지 작가는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는데 제 그림에는 좀 슬프고 아픈 것을 안 넣으려고 했다" 며 "한 점 한 점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화랑에 전시된 이영지 작가의 '수고했어, 오늘도']
작가는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이 위로를 받았다.
이 작가는 "처음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내 그림을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고 누군가를 힐링시켜주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참 오만함이었다" 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 그림에서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남들도 행복한 것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많이 반성했다" 며 "내 주변에 항상 행복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대 때 2년 간격으로 부모를 여읜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상실의 아픔을 달랬다. 그러기에 더 그림에 빠져들고 집중 할 수 있었다.
새 두 마리가 항상 주변을 맴돌고 있는 작품을 보며 이영지 작가는 "그림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난 이렇게 철딱서니 없었구나! 저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라며 "작업을 하면서도 막 울컥울컥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선화랑에 전시된 이영지 작가의 '내 사랑의 무게를 견뎌라']
이영지 작가가 선화랑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6년 '예감'전이다. 예감전은 선화랑에서 그해 처음 여는 전시로 주목할 만한 작가들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원혜경 선화랑 대표는 "예감전 작가 중에서도 한 분 또는 두 분은 2~3년 후에 꼭 전시를 연다" 며 "당시 제가 봤을 때 2년 이내에 무조건 전시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진 작가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영지 작가는 '나무의 작가'라고 불릴 만큼 나무를 많이 그려 왔다. 그에게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삶이자 인생이다.
"무의식중에 점을 찍고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라는 공간이 되는데 나무도 보잘것없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풍성한 한 그루의 나무가 돼 있다.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나무가 모든 인간의 모습 같다."
이번 작품에서도 나무가 많이 등장한다. 나무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듯이 나무 하나만으로도 이야기 구조가 완성된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나무가 화면 안에서 그냥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구분하진 않는다."

[선화랑에 전시된 이영지 작가의 '뭘 해도 좋은걸']
작품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새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다.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낸 것이다. 주변에서 들은 것, 영화에서 나온 장면, SNS 매체에서 나온 얘기, 친구들 만났을 때 들은 얘기 등을 표현했고 작품 제목도 하나하나 신경 썼다"
새가 그의 작품에서 처음부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나무만 있었고 좀 더 재밌는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작가는 그 당시를 외로울 때라고 회상했다.
"재밌는 요소를 넣어보자면서 사람도 넣어보고, 여러 요소가 있을 건데 날아다닐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새라는 것을 찾았다. 누가 보면 비둘기냐 병아리냐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림에 맞춰서 크기를 결정하고 내용만을 담을 뿐이다. 그래서 새들의 표정이 없다"

[선화랑에 전시된 이영지 작가의 '예뻐 죽겠어']
▶백반으로 방충·방습 처리
동양화를 전공한 이영지 작가는 쓰는 재료와 색도 동양적이다.
장지를 아교와 백반으로 방충·방습 처리하고 먹으로 밑바탕을 그리기 시작한다. 원하는 바탕 색깔을 칠한 다음에 새로운 느낌 내려고 마른 붓질한다. 이 마른 붓질로 인해 작품 전체가 비가 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다시 또 색깔을 덮고 다시 붓질해서 밑바탕을 완성한다.
이영지 작가는 "시간이 없다고 백반처리 없이 아교처리만 하고 들어가면 다 썩는다. 종이이기 때문이다" 며 "밑바탕이 마음에 들어야 이파리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배경을 끝내고, 먹으로 알알이 꽃잎의 바깥경계를 그리고 색을 입히면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 꽃의 뭉치가 되고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

[선화랑에 전시된 이영지 작가의 '햇살 좋은날']
▶장지와 분채는 내 그림 인생의 모든 것
모든 작품은 장지 위에 분채를 한 것이다.
장지는 우리나라 전통 종이의 한 종류이며 두껍고 질긴 종이다.
분채는 입자가 고운 색 가루로 아크릴물감과 달리 접착 성분이 없어 물과 아교를 섞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아교의 농도나 색의 배합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영지 작가는 "재료에서는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다. 학교 다닐 때는 오브제를 사용해서 붙이는 것도 많이 했고 여러 재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디테일 적인 것, 파고드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나한테 맞았다" 며 "분채로 밑 작업부터 색을 쌓아 올릴 때 우연히 조금 다른 색이 나올 때가 많다. 장지와 분채가 그런 묘미가 있어서 포기를 못 한다"고 털어놨다.
그만큼 작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을 많이 들이다. 100호 크기의 작품을 하나 완성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그에게 분채는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의 한 종류가 아니라 오래된 벗이며 분신 같은 느낌이다.
"분채는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대학원 때 조교를 하면서 강사들한테 귀동냥으로 들어서 혼자 공부했다. 기본을 배우고 난 뒤에 오래 시행착오 끝에 저만의 아교 농도를 찾아냈다. 후배들에게 제 방법을 가르쳐 줘도 그 사람과 잘 맞지 않는다. 저만의 고유한 배합이 있는 것 같다"
분채 재료는 일본에서 사서 쓴다. 다양한 색이 있다고 해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색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색을 섞어서 쓴다. 어떨 때는 네 가지 색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 낸다.
여러 번의 붓질과 색의 결합은 시간의 흐름을 앞당겨서 오래된 회벽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세필로 수만 번의 선으로 만들어낸 나뭇잎 위에서 가족처럼 단란한 새들의 노래가 들리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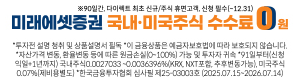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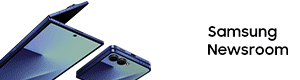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