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는 오줌을 싸고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았다. 영역표시다.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란 뜻이다. 경계를 넘으면 물고 뜯기는 혈투가 벌어진다. 수십만, 수백만 장병이 벽을 넘다 도륙을 당했다. 영역은 그렇게 엄중하고, 그 것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엄혹하다.
업역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은 오줌을 싸고 장성을 쌓는다. 업역과 관련된 선넘기는 본질적으로 생존다툼이다. 돈과 권력이 모이는 곳일 수록 영역표시가 심하다.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3부가 대표적이다. 행정과 사법은 국가고시를 통해 엘리트를 뽑는다. 입법은 공천을 통과해야 하고 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 공천권자는 이른바 내 사람만을 공천하고 유권자는 자신에게 이익인 후보를 뽑는다. 거대한 이너서클이 만들어진다. 수년씩 심지어 십수년씩 젊음을 희생한 사람들만 그 관문을 통과한다. 권력을 가진 당사자들이 장벽을 설계한다. 그래서 그 장벽은 어느 업역의 그 것보다 높고 공고하다.
언론도 장벽이 높은, 정확히 말하면 높았던 업역 중 하나다. 몇 개의 신문과 서너개의 방송만이 존재했던 과거엔 시험의 자격부터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졌다. 그 중 선발된 극소수에게 해당 언론사의 명함과 협회의 기자증이 나왔다. 공인된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증이 없이 취재 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
제 4부라 불리는 언론도 결과적으로는 권력이다. 업역 장벽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다. 하지만 앞서 말한 3부에 비해서는 약한 권력이다. 업역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면 말이다.
언론을 둘러싼 만리장성에 균열이 갔다. 틈새는 이미 쩍 벌어졌고 곧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
만리장성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넘지말고 돌아가는 것이다. 장벽을 따라 돌다보면 언젠가는 장벽의 끝과 만나게 된다.
언론 장벽의 안으로 들어온 침입자들은 심지어 침입의 의사조차 없었다. 자신이 싸우는 지도 모르는 대상과의 싸움은 그 것을 알면서 지켜야 하는 쪽에서 보면 공포다.
언론이 제 4의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건 정보가 하향식으로 유통되고, 언론이 첫 관문에서 그 것을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기업에서 투자자에게 식으로 한 방향으로 흘렀다. 정보 수요자는 언론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정보를 구할 수 없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정보가 쌍방향으로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에게서 정부로, 투자자에게서 기업으로 흐르는 정보가 조직화하면서 힘을 갖게 됐다. 모래알이 모여 바윗돌이 됐다. 인터넷과 통신 등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응집력을 키웠다. 심지어 국민들끼리 투자자끼리는 물론 소비자끼리 유통되는 정보도 권력이 됐다.
하향식 정보는 몇 개의 관문만 지키면 된다. 상향식 정보와 수평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는 다르다. 개개인이 정보의 생산자다. 언론이 그 관문을 독점하는 건 불가능하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한다. 모티즌이란 물방울은 이 플랫폼들 위에서 거대한 파도가 돼 만리장성을 넘었다. 장벽에 막히면 돌아서 흘러들었다.
마크 저커버그 등 플랫폼 사업자는 장벽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용자(물방울)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거대한 파도가 돼 모든 업역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처음부터 알았다.
상대는 싸울 의도가 없는 데 그 존재는 이제 기자들에게 공포가 됐다. 언론은 이제,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모티즌과 유튜버, 인플루언서들과 생존을 건 경쟁을 해야 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싸움의 상대를 찾기도 힘들다. 어쩌면 대상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 외적 갈등은 내적 통합의 동력이라는 데 언론은 언론끼리도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싸울 의도가 전혀 없는 얼굴로 거의 무한한 모티즌들을 용병삼아 전선에 보낸다. 언론도 그렇지만, 택시와 대리기사, 배달원 등 거의 모든 업역이, 특히 권력이 없는 업역일 수록 속수무책으로 플랫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파도가 이미 내부로 깊숙이 들어왔는데, 오줌을 싸고 장벽을 더 높이 쌓는 건 의미가 없다. 선 긋기는 1차적으로 내 영역의 표시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선의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기자들이 살려면 스스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선이 없으면 그 밖의 영역도 내 것이 될 수 있다. 선으로 둘러싼 영역은 확실하지만 작다. 그 밖은 불확실하지만 광활하다. 이미 그 가능성의 영역으로 뛰어들어간 기자들이 적잖이 있다. 짐벌과 고릴라 삼각대를 든 기자들을 취재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현장도 정부와 기업의 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는 상당히 성공도 했다. 물론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언론만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이 분명 존재한다고도 믿는다.
싱클레어는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데미안이 그에게 속삭인다. “이젠 네 스스로 그 것을 해야할 때”라고. 무시무시한 건 알을 깨고 나가도 결국 온라인 플랫폼의 손바닥 위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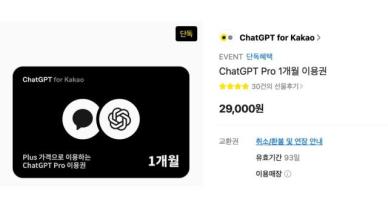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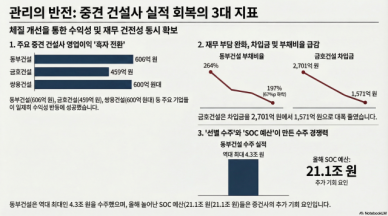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