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기준금리 추이[자료=한국은행, 미국 Fed / 아주경제 DB]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기업이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현금을 쌓아두는 모양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물 경기 악화와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30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살펴본 결과 9월 말 현금성 자산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 자산은 290조9800여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현금 자산은 250조원이 넘는다. 삼성전자가 128조8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홀딩스가 20조9400억원, 기아가 20조3100억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19조5900억원과 10조96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경기 악화와 무관치 않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올해 들어 세계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종식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되살아날 기미를 보였으나 여러 악재가 한 번에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물가를 압박했고 국제유가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를 부추겼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각국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전 세계에 돈이 풀린 상황이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나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는 미 달러화 가치 급등으로 이어졌다.
대다수 국가는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한국도 고물가·고환율 현상이 발생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일컫는 '3고'가 촉발된 배경이다.
기업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오르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기업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연관 제품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이 떨어졌다. 3분기 국내 주요 기업 매출이 지난해보다 성장했는데도 영업이익은 줄줄이 감소한 이유다.
수익성이 악화하면 기업은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된다. 여기에 지난 9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마당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며 기업의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으로서는 들어오는 현금을 최대한 쟁여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기업이 올해 들어 현금 비축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돈줄이 말라가는 만큼 기업은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려는 유인이 강해진다"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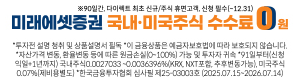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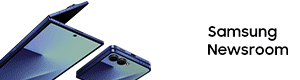















![[현장]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53589093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