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93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라는 야심 찬 계획에 시동을 걸었지만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데이터 공급자인 뉴스 업계와의 가격 책정 문제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KT, 네이버클라우드, SKT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최대 5개의 'AI 정예팀'을 선발해 GPU 자원과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공고했다. 202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AI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하지만 AI 모델의 성능을 결정할 고품질의 뉴스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4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소속 언론사 저작권 담당자들을 소집해 데이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AI 기업들에 뉴스 데이터의 가격표를 미리 제시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언론계의 고민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과거 정부 주도의 '말뭉치' 구축 사업 등에서 언론사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귀중한 뉴스 데이터를 넘겨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뉴스 저작권의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흐름 속에서 또다시 콘텐츠 가치를 헐값에 넘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뉴스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는 선언에 있다. 수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생산한 고품질의 뉴스 콘텐츠를 AI 기술 개발의 재료로 사용하려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AI 기업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결국 정부의 AI 주권 확보 프로젝트의 성패는 핵심 데이터 공급자인 언론계의 전략적 선택에 좌우될 전망이다. 단기적 공급 실적과 장기적인 콘텐츠 가치 사이에서 언론계가 내놓을 해법과 이를 수용하는 정부 및 AI 기업의 태도에 '한국형 AI'의 미래가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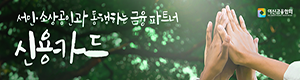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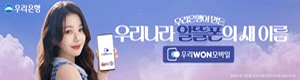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