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는 보안 관리 부실의 결과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발생했지만 정황이 발견된 건 26일로 약 2주 동안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됐다. 해킹 원인은 지난 2017년 보안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중 자주 사용하지 않던 서버 부문의 패치 누락으로 이는 전형적인 내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를 둘러싼 보안 투자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정보보안 예산·인력을 강화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5년간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4.2%에서 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도 기존 16명에서 30명까지 늘렸으나 전체 IT 인력대비 비중은 43%에서 20%까지 급감했다. 이는 고객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는 해명이다.
피해 대책으로 제시한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피해 전액 보상 등도 고객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유출은 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금전적 피해 외 다른 피해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롯데카드가 제시한 피해자 전액 보상은 금전 피해에만 한정됐다.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도 피해 고객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고객, 롯데카드에 신뢰를 잃어 탈회를 결정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피해 고객 일부는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카드에게는 보안 관리를 강화할 기회가 있었다. 앞서 SKT·SGI서울보증 등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프로세스 및 서버 보안 검사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롯데카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다하려면 기존 발표한 보안 투자 강화를 넘어 인프라·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내부 보안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고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정부·당국에서는 금융사의 보안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은행 등 금융사의 정보 보안 관리가 타 업권 대비, 글로벌 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투자 비용·인력 구조·점검 현황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결정할 때 유의미한 기업 평가 지표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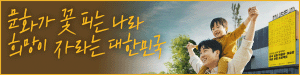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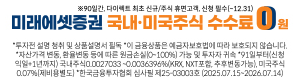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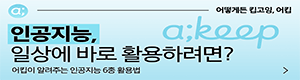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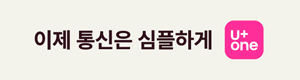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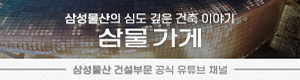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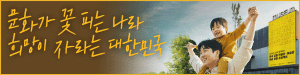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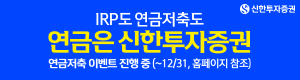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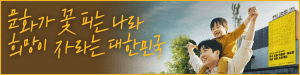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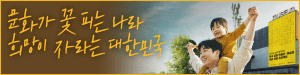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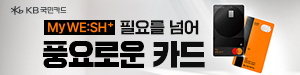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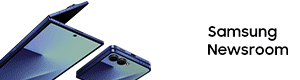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