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4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력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화력, 원자력 등 대형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5월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발표하며 신규 발전원의 전력 계통 진입을 막겠다고 알렸다. 태양광 발전이 필요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전력망에 부담을 주게 된 만큼 신규 태양광 발전을 줄여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출력제어는 전력망 안전성을 위해 발전원과 계통 간 연결을 끊거나 발전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계통 진입 통제는 전국 205개 변전소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2031년 12월까지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태양광 설치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이 10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태양광을 설치해도 전력망에 연결할 수 없어 사실상 7년 4개월간 신규 태양광 설치는 중단되는 셈이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력망엔 상당 부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올해 월 평균 전력 사용량 최대치는 지난달 87.8기가와트(GW)로 가장 높았다. 지난 5월은 64.5GW로 가장 낮았다. 지난달 전력 사용이 최저치에 비해 23.3GW(36.1%)나 늘어났음에도 전력망엔 문제가 없었다.
전력망을 운영할 때 연간 최대치 기준 50% 가량을 계통 내 여유분으로 남겨뒀기에 가능했다. 일부 전력망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이런 상황에도 신규 태양광 설치를 막는 이유는 대형 발전소 위주로 전력 계통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량 20메가와트(㎿)이상 '중앙급전 발전기'를 위주로 짠다. 대부분의 석탄·액화천연가스(LNG)·원자력 발전소가 이에 해당한다.
전력공급 계획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발전량보다 전력 수요가 적으면 비중앙급전 발전기인 재생에너지부터 출력 제어를 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처럼 수요가 최저치인 경우 태양광부터 전력망에서 제외시킨다.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 출력제어가 빈번한 이유다.
지난 5월 정부가 송전망 포화를 이유로 태양광 설치 제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부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대형 발전소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력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부터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은호 전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장은 "과거 석탄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 가격이 저렴해 유리했지만, 최근엔 석탄 가격이 올라 발전 단가 측면에서 우위 요소도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시설을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로 연계해 대형 발전소처럼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 전 원장은 "첨단 기술로 전력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각 발전소를 연계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동원해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야간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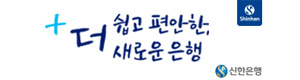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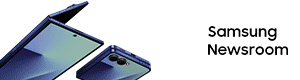












![[현장] 강동한 넷플릭스 VP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넷플릭스, 2026년 비전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20452596075_388_136.jpg)

![[SWOT 난제분석] 실적은 최고, 변수는 ELS…양종희號 KB금융의 질적 전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123134890222_388_136.jpg)

![[SWOT 난제분석] 현대해상 지난해 손익 하락세...영업 체력·자본 강화 전망에 성장 전환 가능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110416595732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