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으로 실제 투입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리비 간 차이가 커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SH·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따르고,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감리비를 산출·운영한다. 분양가 산정 시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에 비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 1305세대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분양주택 분양가에 반영되는 감리비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에 따라 약 18억원(공사비 대비 0.55%)에 불과해 투입한 감리비 약 130억원 중 13.7%만 분양가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차액인 약 112억원은 공사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리비를 지급 받아 '부실 감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원~11만원으로 평균 8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공공 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의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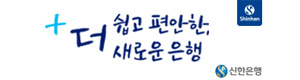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