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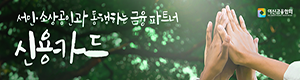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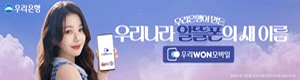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