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자제품과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중국 같은 국가에 면죄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면제는 없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졌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강경 기조의 재확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중국산 반도체 제품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에 맞불 관세를 예고했다. 수입 시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정면 충돌이라는 평가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양국에 거점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동시에 중국 시안에서는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2나노급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동시에 중국 난징의 28나노급 공장도 유지하며 현지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설계 중심의 미국의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도 생산은 대만, 설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모두 수출 규제나 통관 장벽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첨단 장비와 IP를 독점하고 있고 중국은 최대 수요처이자 패키징 중심지다. 또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도 기술 이전이나 합작을 요구하고 수입 절차에도 제약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여파가 한국 기업에 특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완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도 덩달아 감소한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78.4%는 중간재이고 대부분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330억 달러,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중국에서 완제품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다.
미중 간 충돌이 격해질수록 한국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줄타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기술과 시장 양쪽에 의존하는 산업인데 그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라며 “현실적으로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기능별로 분산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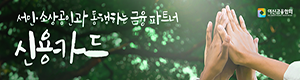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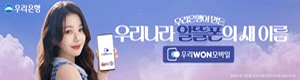






![[세미콘코리아2026] 반도체 경쟁 축, 장비에서 공정 내부 물류로…세미콘서 확인된 자율주행 로봇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62028118949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