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석 현대차그룹 정책조정팀 상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조사가 직접 자동차 안전을 입증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인 '자기인증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자동차(EV) 등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하는 시대에 알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남석 현대차그룹 정책조정팀 상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 여당 의원들과 튜닝업계 관계자,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 완성차 브랜드 측이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튜닝산업 역할과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상무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적 문제나 배터리 문제 등이 나타나는 데 제조사가 기준을 정하는 자기인증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신뢰할 지 모르겠다"며 "제조사가 나서 인증을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증하는 절차인 형식승인제도가 소비자 신뢰감 형성에도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의 안전에 직결된 자동차가 국가의 일정 수준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기인증제도가 아닌 '형식승인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모습[사진=현대자동차]
현행법상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단체는 정부에 직접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해야 한다. 자기인증제도는 2003년 자동차관리법 제3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제조사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인증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일본과 유럽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판매 전 안전기준을 검토해 인증을 내리는 형식승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김 상무는 또 "자기인증제도는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입됐는 데 당시에는 '정부 허락을 받아야 신차 출시가 가능한 법과 제도는 자동차 산업 연구개발(R&D)을 제한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튜닝 시장과 산업이 더 확대되려면 완성차 인증은 형식승인제도로 고치고 튜닝 자동차는 자기인증제도로 바꾸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상무는 이날 튜닝산업 안전과 관련 현대차가 개발 중인 첨단 운전 지원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율주행 관련 부분을 언급하며 "현대차는 현존 기술로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지만 기술 구현과 상용화는 다르다"며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차가 도로에 있고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하는 사회적 통용성도 상용화에는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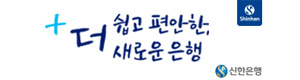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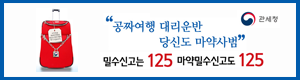










![[인터뷰] 김건수 큐로셀 대표 CAR-T,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암의 방패를 깬 림카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092445559808_388_136.jpg)




![[현장]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44238975400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