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한 뒤 무려 30년 동안 자리를 지켜 왔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42.8%, 낸드 점유율은 34.3%였다. 일찍이 재고 줄이기에 나선 SK하이닉스나 미국 마이크론보다 한 발 늦게 감산을 시작하면서 점유율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HBM과 300단 이상 적층 낸드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각각 최고 사양, 최고층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삼성전자는 자존심을 구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정보를 저장하는 셀을 수직으로 321단까지 쌓아 올린 1테라비트(Tb) 트리플 셀(TLC) 낸드를 이달 공개했다. 이어 5세대 HBM3E 샘플을 고객사인 미국 엔비디아에 공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본 꺾은 저력은 '투자'…'초격차' 유지에 사활
점유율 집계에서 보듯 HBM과 낸드 적층 경쟁에서 밀렸다고 해서 삼성 반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이어서 (이것만으로) 전체 메모리 경쟁력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300단 이상 낸드 역시 셀을 많이 쌓을수록 반드시 성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시각이다.
삼성전자가 앞선 분야는 여전히 많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한 쌍을 이루는 그래픽 D램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32기가비트초(Gbps) GDDR7 D램을 개발했다. 공정 미세화 한계를 극복할 최신 기술로 주목받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도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다. 메모리 선두를 유지할 기술적 자산은 삼성전자가 아직 한 수 위라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1980년대 반도체 사업에 도전하며 도시바와 파나소닉 등 쟁쟁한 일본 업체를 넘어 2000년대 '초격차' 시대를 연 비결은 빠른 공정 전환이었다. 최신 공정을 개발한 뒤 양산 시기를 짧게 가져가고 바로 다음 공정 개발에 착수하는 식이었다. 그만큼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열중했다는 얘기다. 기존 제품에서 새 제품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짧은 만큼 선두를 금새 따라잡았고 이후에는 격차를 벌려 나갔다.
그런데 이 격차가 1~2년 단위에서 몇 개월 수준으로 좁혀졌다. 반도체 산업이 성숙하면서 선두권에서는 한 업체가 최고 용량 D램을 개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업체가 같은 용량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이 잦아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미국 GPU 설계 전문회사(팹리스) AMD에 4세대 HBM3를 공급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에는 5세대 HBM3P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면서 R&D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반도체 불황으로 글로벌 팹리스·파운드리(위탁 생산 전문) 회사가 잇따라 지출 다이어트에 나선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4~6월)에만 R&D 7조2000억원, 시설 투자 14억5000억원 등 20조원 넘는 투자를 집행했다. 대부분은 반도체 몫으로 돌아갔다.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에는 방대한 투자 계획이 담겼다. 총 투자액은 처음 비전이 발표된 2019년 133조원에서 2년 뒤인 2021년 171조원으로 늘었다.
경기 용인시에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올해 3월에는 2042년까지 300조원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 기간 미국에는 200조원 넘는 돈을 쑫아붓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 평택캠퍼스와 기흥캠퍼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州) 테일러에 공장 신·증설이 진행 중이다. 투자액을 다 합치면 웬만한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
삼성전자가 투자의 고삐를 더욱 죄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메모리는 초격차 유지가 과제지만 시스템 반도체로 불리는 비메모리는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 탓에 투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알짜 주식이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까지 현금 확보에 나선 것도 결국은 투자가 목적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투자 재원을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두 가지 큰 과제를 풀어야 한다. 파운드리는 엔비디아와 AMD, 퀄컴 같은 대형 팹리스를 고객사로 유치하고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도 판매하는 회사다. 여기에는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디스플레이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서 나온 모바일용 D램과 낸드가 탑재된다. 배터리는 삼성SDI가 공급한다.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까지 과정이 수직계열화 돼 있다는 게 여타 스마트폰 제조사와 다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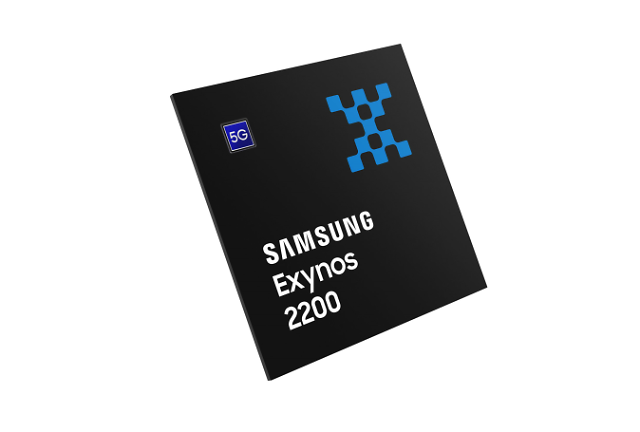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 아킬레스건은 AP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제품에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퀄컴 스냅드래곤, 미디어텍 헬리오 등을 나눠 쓴다. 업계에서는 전체 스마트폰 가운데 퀄컴 AP 탑재 비중을 50~60%, 엑시노스는 30~40% 정도로 본다.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기기에 주로 들어가는 미디어텍 AP는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로서는 자체 AP인 엑시노스 대신 스냅드래곤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상대적으로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게 엑시노스는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 일부 제품에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됐다가 발열과 성능 저하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과 Z 플립·폴드5 모든 제품에 스냅드래곤 8 2세대(Gen2)를 사용 중이다.
스마트폰 흥행에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뼈아픈 대목이다. 퀄컴이 TSMC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자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AP 비용이 지난해보다 30% 늘었다.
퀄컴이 스냅드래곤 8 Gen2 생산을 TSMC에 위탁하면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잘 팔릴수록 파운드리 경쟁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갤럭시 S23에 들어갈 퀄컴 AP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퀄컴 AP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엑시노스 2400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해당 AP에 적용된 4나노미터(㎚·1㎚=10억분의1m) 공정의 수율은 75%까지 올라왔다고 전해진다. 성능은 스냅드래곤 8 Gen3에 근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아직은 먼 얘기지만 차기 엑시노스의 성공은 반도체 비전 2030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400을 통해 파운드리 경쟁력과 AP 설계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4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수율에서 TSMC에 밀리지 않는 동시에 AP 점유율을 높일 기회인 셈이다.













![[지다혜의 금은보화] 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0259811419_388_136.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03247236525_388_136.jpg)
![[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4/20260214081513276488_388_136.png)
![[류청빛의 요즘IT]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11825540250_388_136.png)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기아 계기판 리콜…수입차 후방카메라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01512527374_388_136.jpg)
![[방예준의 캐치 보카] 펫보험 가입 증가세...보장 확대·기부 연계 상품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095756471250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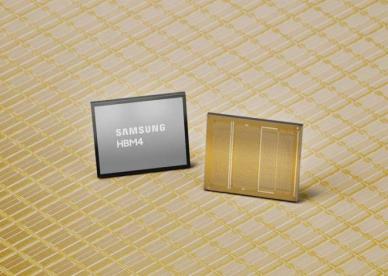
댓글 더보기